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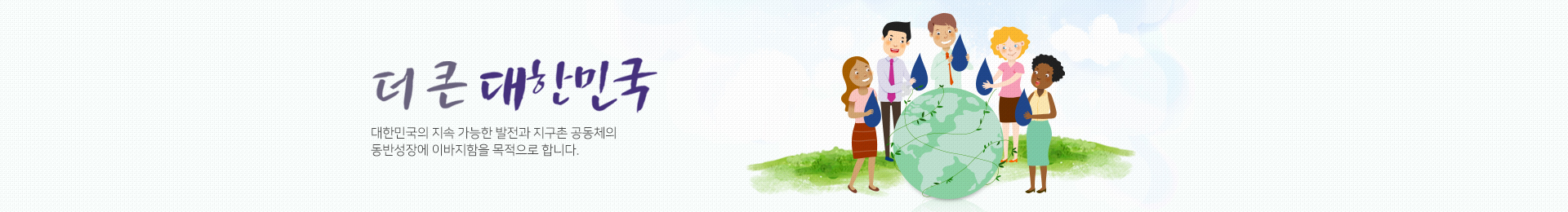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존경하는 압둘라 귤 대통령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대표단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7년 전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류 역사의 깊은 숨결과 눈부신 문화를 간직한 터키의 매혹적인 모습에 반해, 꼭 다시 한 번 오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소망을 이루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아울러 재작년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주셨던 귤 대통령을 다시 만나 뵙고 우정을 더욱 두터이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대통령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야말로 가장 강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말이 우리 두 나라 관계를 나타내는 데 꼭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있지만, 물리적 거리를 넘어 매우 특별한 인연을 쌓아 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한 TV방송사에서 한 터키 군인과 한국인 소녀 사이에 있었던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1950년, 25세의 청년 슐레이만 비르빌레이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을 지키기 위해 터키군의 일원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해 11월, 적과의 처절한 백병전이 끝난 직후 슐레이만 하사는 홀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어린 여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 “아일라”(Ayla)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딸처럼 돌보았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슐레이만 씨가 귀국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도 아일라를 잊을 수 없었던 슐레이만 씨는 아일라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예순이 넘은 아일라 김은자 씨도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침내 두 사람은 기적적으로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과 터키의 깊은 인연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터키는 미국, 영연방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참전용사 중 721명의 젊은이들이 산화했고 그 가운데 462명은 한국 UN묘지에 묻혀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각별한 형제국가, 말 그대로 ‘칸 카르데쉬(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대통령님,
1957년 수교 이래 한국과 터키는 정치, 경제, 문화,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돈독한 교류협력관계를 가꾸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국 교역이 세계경제위기를 뚫고 60억불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한-터키 FTA가 체결되면 양국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포괄적·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동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터키는 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세계 문명의 교량으로서, 이들 지역 모두와 유대를 깊이하며 문명의 화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의 봄’ 이후 역내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아프리카와 아랍의 많은 국가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UN, G20 등 국제외교무대에서도 신흥 주도국으로 부상하며 세계의 공동번영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국제외교역량과 눈부신 경제발전을 보며 세계의 많은 언론인과 학자들은 터키를 21세기의 주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약동하는 터키를 창조하고 있는 터키 국민들과 그 선두에서 나라를 이끌고 계신 귤 대통령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날로 뻗어나가는 터키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 나의 방문으로 우리 두 나라 관계가 더욱 깊어져 21세기에 함께 세계사의 중심무대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아나톨리아 반도에 온 사람들은 먼저 자연의 환상적 아름다움에 매혹됩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시 역사와 문화의 풍요로움에 감동하게 됩니다.
나는 이 땅이 역사와 문화의 보고(寶庫)라기 보다 역사와 문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차탈회윅에서 인류가 오랜 방랑을 멈추고 처음으로 대지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간은 이곳에서 ‘자연인’으로부터 ‘문화인’으로 탈바꿈하였고, 대지 위에 ‘그의 이야기’(History)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나톨리아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고향이고, 우리 모두는 아나톨리아의 후예들입니다.
이 유서 깊은 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귤 대통령 내외분께 감사드리며, 두 나라의 공동 번영과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셰레페(Serefe/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