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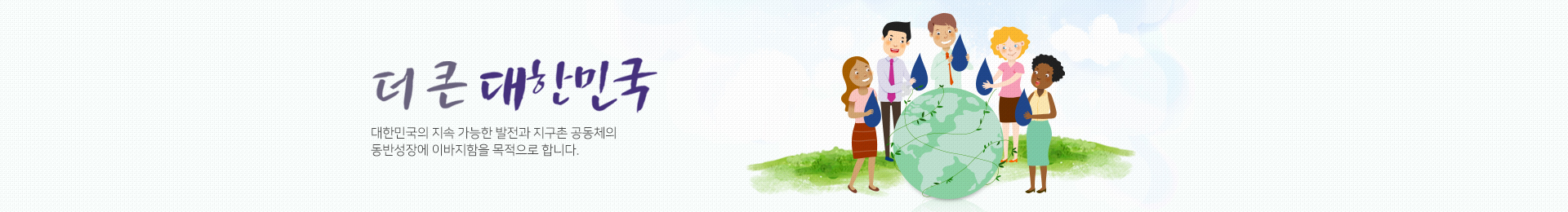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의 쓸쓸한 뒷모습
박정희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79년 10월 현대건설 사장을 할 때였다. 그날 아침 청와대 경호실에서 연락이 왔다. 박 대통령을 만나러 오라는 것이었다. 면담 시간은 오후 4시인데 오전 10시까지 세종문화회관으로 오라고 했다.
세종문화회관에 가보니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각계각층 저명인사들이 20명가량 모여 있었다. 경호실에서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며 대통령에게 거기 적힌 대로 말하라고 했다. 짐작컨대 부마사태 이후 상심한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같았다.
내게 건네준 봉투를 열어보았다. 운동권 출신의 입장에서 부마사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하고, 대통령께 괘념치마시라는 위로를 전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 대통령 앞에 가서도 나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다. 도저히 대본에 적힌 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말하자니 회사에 피해를 입힐까 걱정됐다. 고민은 엉뚱한 데서 해결됐다.
내 바로 앞 순서는 시골에서 올라온 나이 많은 새마을 지도자였다. 그는 박 대통령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너무 긴장해 외웠던 내용을 잊어버린 것이다. 순간 대통령 뒤에 서 있던 경호 책임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외운 내용을 잊어버리셨군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박 대통령이 말했다. 그 덕분에 나는 난처한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접견실을 나서는 박 대통령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며칠 뒤인 10월 26일, 박 대통령은 삽교천 준공식에 다녀온 후, 궁정동 안가(安家)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지금도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박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하다 감옥에 갔다. 그 이력 탓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사회 진출을 못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숨 가빴던 산업화시대를 박정희 정부와 함께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현장에 있었으며, 열사의 땅 중동을 뛰어다녔다.
내가 대통령이 된 후 만난 한 아프리카 지도자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저개발국가가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독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에 빗대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였다. 나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렸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장기 독재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을 탄압했다. 한편으로 그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통해 한국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지도자였다. 그에게는 과(過)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공(功)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독재는 1960~70년대 초기 경제개발에는 효율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파생된 부작용은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지만 법질서 부문은 OECD 30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권력형 비리와 불법 폭력 시위 등이 원인이었다.
이외에도 노사의 극한 대립이나 지역주의, 여야의 타협 없는 정쟁 등이 문제였다. 모두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에서 파생된 부작용들이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그러나 선진국가가 되는 데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는 그 아프리카 지도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민주화와 경제개발이 함께 가야 합니다. 경제발전 없이는 민주화도 요원하지만, 민주화 없는 경제개발도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 국보위에 맞서다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무소불위인 시절이었다. 신군부는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이라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다.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화학공업의 중복 투자를 통합한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으로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발전설비 중 한 가지를 포기해야 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막 세계로 진출하려던 시점이었다. 발전설비 역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던 현대건설의 주력 업종이었다. 어느 것을 잃든 현대그룹으로서는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거듭된 회의 끝에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회사 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홀로 국군 보안사령부에 출두했다. 그러나 국보위는 현대그룹이 자동차를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사전에 경쟁기업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나는 보안사에 세 차례나 불려 다니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나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네 번째 보안사에 불려갈때 정 회장은 도장을 내주었다. 당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TBC 방송사를 포기하자 정 회장도 더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가서 노력해보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합의해줄 수밖에 없어.”
나는 도장을 받아들고 보안사에 출석했다. 내가 기댈 것은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라는 원칙론밖에 없었다. 국가경제는 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고 말했지만 신군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도장을 건넸다.
“내 손으로는 도장을 못 찍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당신들이 찍으시오.”
한 장교가 도장을 들고 찍으려는 순간이었다. 내 의중을 간파한 책임자급 장교가 그를 제지하며 벌떡 일어났다. 자신들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음을 알아챈 것 같았다. 그 장교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빌어먹을! 당장 나가!”
보안사를 나오니 이미 새벽녘이었다. 현대 사옥 앞을 지나는데 정 회장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 회장은 모두 퇴근하고 텅 빈 회사에 남아 밤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바로 정 회장 사무실로 올라갔다. 들어서는 나를 보고 정 회장이 물었다.
“도장 찍어줬나?”
“안 찍었습니다. 내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회장은 다시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어이, 당신 눈에서 피가 나고 있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정말 내 눈에 붉은 액체가 고여 있었다. 손수건으로 닦아보니 피눈물이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피눈물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승산이 있는 싸움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보위는 자동차 산업 통합 문제를 자신들 뜻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이 문제는 상공부로 이관됐고 결국 자동차산업은 통합되지 않았다.
5공 초기에 현대그룹과 신군부의 관계가 아주 나빴던 데는 이 같은 이유가 작용했다.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은 사퇴까지 종용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정 회장에게 권력에 대한 환멸과 동경이라는 모순된 정서를 심어주었다. 결국 정 회장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