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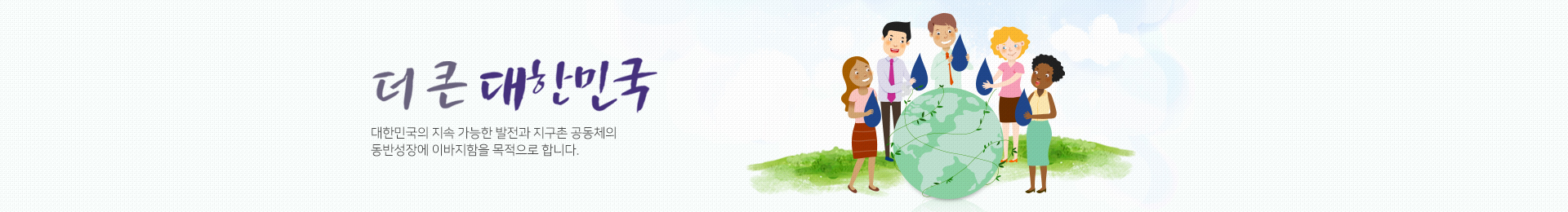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한겨울의 밀짚모자
어린 시절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나는 남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도 못했다.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머니는 행상을 그만두고 국화빵 굽는 일을 시작하셨다. 나는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국화빵을 굽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다. 하루는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이제부터 너도 따로 장사를 하나 해라.”
며칠 후 어머니는 뻥튀기 기계를 한 대 빌려다 주셨다. 뻥튀기 기계 조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나는 며칠 동안 온도 조절하는 법, 시간 맞추는 법 등을 연습한 뒤 어머니가 정해준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이 여자 중·고등학교로 가는 길목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장사를 마치면 바로 학교에 가야 했기에 교복 차림으로 일해야 했다. 뻥튀기를 만들다 보면 얼굴과 손은 그을음으로 온통 시커멓게 됐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묘안이 떠올랐다. 챙이 큰 밀짚모자를 하나 구해 푹 눌러 썼다.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고 뻥튀기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보러 오셨다. 내 앞에 한참을 서 계셨지만, 나는 푹 눌러 쓴 밀짚모자 때문에 어머니가 오신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힘껏 쥐어박으며 호통을 치셨다.
“장사를 하려면 손님과 눈을 마주쳐야지. 무엇이 창피해서 이 추운 겨울에 밀짚모자를 쓰고 있느냐. 죄를 짓거나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네가 네 힘으로 살기 위해 당당하게 일하는데 무엇이 부끄러우냐!”
그때는 어머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볼까 창피했다. 길에서 큰소리를 치시는 어머니가 부끄러웠다.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자식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다. 철없던 시절이었다.
희망이 없는 나날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부모님은 단칸방에 세 들어 살면서 이태원 시장에서 생선 좌판 장사로 생계를 꾸리셨다. 당시 이태원은 서울 외곽의 변두리 중 변두리였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눕기에도 비좁은 방에 나까지 얹혀 살 수 없었다. 마침 서울에서 방을 얻어 자취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 친구의 방에서 겨우 잠만 자면서 막노동판에서 일당 노동자로 일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치고 힘든 생활이 계속됐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쓰던 라디오를 갖다 주었다. 당시 청취자들이 보낸 사연을 소개하며 음악을 틀어주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있었다. 나는 밤마다 그 프로그램을 들으며 지친 마음을 달래곤 했다. 주로 평범한 학생들의 일상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당시의 내 처지와 비교되어 울컥하곤 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방송을 듣다 좌절감에 나도 모르게 한강다리로 달려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돌아서곤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너는 나중에 잘될 거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 만일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막노동이라도 일이 있는 날이면 그나마 괜찮았다. 그러나 일당 노동자다 보니 일거리가 없는 날이 더 많았다. 당시 나는 ‘내일 일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직장’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일정한 직장에 매일 출근하고 다달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일거리가 없는 날이면 딱히 갈 데도 없어 길거리를 배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