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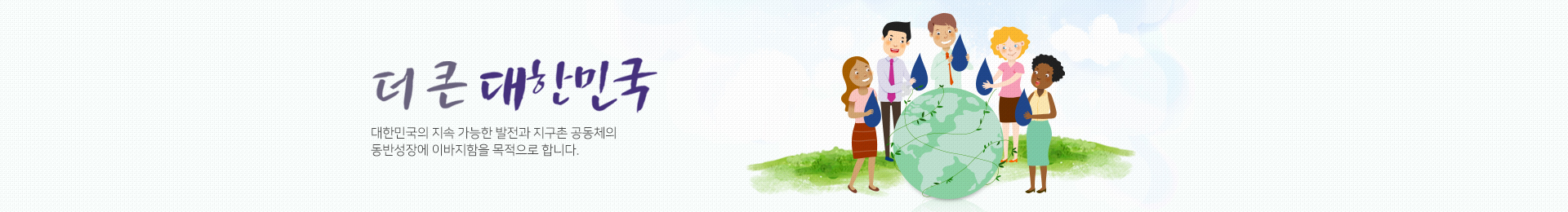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아직 청계천이 공식 개장되지 않은 2006년 5월,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청계천 복원을 커버 스토리로 다룹니다. 빠른 개발의 상징이었던 서울의 친환경적인 변화가 서울을 더욱 매력적이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바꾸고 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 10주년을 맞아 당시 보도를 소개 합니다.
Saving Seoul
Pollution is ruining the quality of life in much of urban asia. but seoul’s transformation into a greener city proves the tide can still be turned
By Bryan Walsh
Standing ankle-deep in the frigid waters of Seoul's reborn Cheonggyecheon stream, a blustery March wind whipping through his suit, Mayor Lee Myung Bak could be forgiven for reconsidering this whole environmentalism thing. As a young employee at Hyundai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in the 1960s, Lee helped pave over the once polluted stream, burying it under an elevated highway that would carry about 168,000 cars a day into the heart of the city. It was the kind of massive modern development that Lee later repeated throughout South Korea during his concrete-pouring tenure as CEO of Hyundai Construction and other Hyundai affiliates in the 1970s and '80s?a period when he earned the nickname "the Bulldozer." Lee kept on bulldozing when he became mayor of Seoul in 2002, but this time with a very different purpose. He started with Cheonggyecheon, ripping down the highway, tearing off the paving, pumping in water and landscaping the banks to create a 5.8-km-long, $360 million piece of urban watershed?in which he's currently standing, stoically enduring the early-morning chill. "The stream is cold, but that means it's clean," says Lee. "When it's warmer, young boys and girls will play in this water. I'm very happy with it."
Seoul-a city long synonymous with unchecked urban development, where Parks were more commonly found in the phone book than on the streets-is growing green. Besides the restored Cheonggyecheon, which opened last October, the city has helped plant some 3.3 million trees since 1998 and recently developed Seoul Forest, a $224 million patch of urban woodland comparable to London's Hyde Park. A cutting-edge, clean-running transit system is slowly weaning Seoulites off their auto addiction. New museums including the Leeum, which houses Samsung's corporate art collection in a stylish building designed by three different world-classarchitects, are feeding the city's growing appetite for culture. And when soccer-crazed Seoulites gather by the thousands in front of City Hall this summer to cheer South Korea's performance in the World Cup, as they did in 2002, they'll be celebrating ona neatly trimmed lawn called Seoul Plaza. "When the Korean economy was just trying to get back on its feet after the war, having these parks was a luxury," Lee says. "But now we try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function and the environment, and whenever we have to choose, we try to put the environment first."
The greening of Seoul has ramifications that go beyond the mountains that ring the city. If this concrete jungle can shift into clea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en there's hope that other messy, environmentally challenged Asian cities like Beijing, Bombay and Jakarta can do the same. The South Korean capital's example could be especially instructive for its fellow Asian Tiger Hong Kong, where short-sighted political leadership has allowed the environment to degrade alarmingly (see story, page 21). "Seoul is an interesting model in terms of a megacity," says Karl Kim, an urban-planning expert at the University of Hawaii who has traveled back and forth to Korea for the past two decades. "There are lessons to be learned here abou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You want to be able to not just do business, but to live in these cities."
For all the commotion they're causing at Cheonggyecheon on a Saturday afternoon, the two celebrities might be film stars or footballers. In fact, they're a pair of mallard ducks, cruising as imperiously down the restored stream as fowl can manage while being pelted with bread crumbs by children giddy at the sight of actual nature. Though wildlife has returned to the stream gradually, people have come immediately, and in large numbers. The city clocked 10 million visitors to Cheonggyecheon within three months of its opening. Beginning a few hundred meters behind City Hall, the stream runs in a dugout below street level, giving respite from the traffic and noise. Office workers on lunch breaks and couples on dates follow the current as it tumbles over waterfalls, squeezes through stepping-stone crossings and flows beneath 22 different bridges, including two modeled on stone relics from the early Chosun dynasty. "This is the first time I've come down, and I really like it," says 59-year-old Chung Sook Tak, standing near the restored Gwanggyo bridge. "The area was so polluted before. I never thought it would turn out this well."
Cheonggyecheon, which means "clear valley stream," has been a mirror of Seoul since the nation's capital was first moved there in 1394. During Chosun times, Cheonggyecheon was a prime site for laundry, gossip and kids at play, and as early as 1760 the government began landscaping it, employing 200,000 men to build stone embankments along the stream to prevent floods. As Seoul expanded, the water grew foul, becoming little more than an open sewer after the Korean War, when refugees built shantytowns along its banks. After South Korea's development kicked into gear, authorities were quick to hide the stream with the highway, a symbol of Seoul's rush to modernize regardless of the environmental cost. "Under the highway, the area was filthy, and population and business decreased," says Seoul Vice-Mayor Chong Seok Hyo, who led the stream project in its later stages. "There was a need to change the environment totally."
The idea of restoring Cheonggyecheon had been kicked around by urban-development experts for years before Lee adopted it as a mayoral campaign promise in 2002. Shortly after his victory, Lee confidently announced that he'd tear down the highway and renovate the stream, and that it would all be completed in just three years. Many experts were doubtful. "I thought he was nuts," says Karl Kim. "Where would the cars go?" But green initiatives like the stream project have increasing public support from Seoulites who have come to expect the city to work for them, not the other way around. Rising incomes play a part in the priority shift, but Kim Won Bae, a director at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a Seoul-based think tank, traces the change back to disasters like the collapse of the shoddily constructed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1995, which killed 501 people, and the economic crisis of 1997. "Those events made a lot of people think again about what economic growth was all about," he says. "Now people in Seoul want to enjoy life and be proud of themselves and their city. They want to say, 'I live in Seoul, and Seoul has this or that.'"
There's also mounting skepticism about the assumption that clean, attractive environs come at the cost of economic performance?a belief still widely held even in advanced Asian cities like Hong Kong. "If we don't place an emphasis on environmental friendliness, not only will citizens leave the city, but foreign investors won't choose Seoul," says Mayor Lee. "I believe that over the long term, choosing the environment serves a dual purpose." That choice can be made in part because the Korean economy is increasingly high tech and high glamour. Newer industries like telecom and film generate far less pollution than the heavy manufacturing that once defined South Korea. Tocapitalize on the country's edge in information technology, Seoul is developing the $2 billion Digital Media City (DMC), a next-generation office park built on a reclaimed toxic landfill. Lured by cheap land and eco-friendly surroundings like the World Cup Park, Korean IT companies including LG Telecom and Pantech are currently building research-and-development centers in the DMC, which is set to launch by 2010. The project will also feature Digital Media Street, a playground for tech companies to try out their latest gadgets, such as smart streetlights that brighten as people approach them. It all sounds suspiciously like a high-tech white elephant in the making. Think of Hong Kong's expensive failure Cyberport. But the DMC only needs to give a sharp boost to South Korea's already thriving IT sector, not create it from scratch, which takes some of the pressure off. "Once it launches, we think the DMC will function as planned without interference by the city government," says Kang Chon, a city official who works on the office park. "After all, we don't want to act like communists."
Perish the thought, but it's doubtful that Seoul would have become so green without an activist government and nowhere is that more evident than in its new transit system. With nearly 2.8 million automobiles in the city (compared to fewer than 600,000 in Hong Kong), Seoul traffic can be sclerotic. Lee made getting passenger cars off the roads a priority, but expanding the city's impressive subway system wasn't possible. Adding a single kilometer of subway track can cost $100 million. So officials turned to the city's decaying buses, drawing up a plan to rationalize and expand routes, add 74 km of rapid bus-only median lanes on arterial streets, synchronize schedules with the subway and improve overall service. Buses would be equipped with gps sensors that would allow traffic officers working from a high-tech control room to track their movements throughout the city and adjust routes automatically for maximum efficiency.
It was a big change, and the government decided to implement the entire revamp overnight on July 1, 2004. The initial result was pandemonium. The new smart fare card malfunctioned, passengers couldn't understand the changes and some bus drivers didn't know the new routes. "It was like hell," says Eum Sung Jik, head of the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The public revolted and the mayor was forced to apologize three days later, but the reforms stayed. "I was convinced that it was the right way to go," says Lee. The glitches were worked out, and within three months public opinion had turned in favor of the new system; bus ridership reversed a historic decline and began rising. Thousands of buses running on low-polluting compressed natural gas have been added to the fleet, and last year the U.S. green groups Environmental Defense and the Transport Research Board honored Lee with the Sustainable Transport Award for his reforms.
Some deride Cheonggyecheon as a developer's artificial idea of what urban ecology should be. "Environmentalists like to call it the 'fish tank,'" says Lee Cheol Jae, a water expert at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who says it will cost nearly $2 million a year to pump water into Cheonggyecheon, which is often dry on its own. "It's a fish tank that cost 360 billion won." Over tea in Insadong, the cheery, traditional shopping district near downtown Seoul that she helped plan, architect Kim Jin Ai makes the case that Cheonggyecheon is just fast-track overdevelopment by another name. "In the 1970s and '80s, Mayor Lee put up huge developments, and he never really came out of that mindset," she says. "I think he made a very artificial stream." Insadong's pedestrian-friendly streets, narrow alleyways and traditional tea shops offer a more natural atmosphere than the heavily landscaped Cheonggyecheon, she maintains.
Lee doesn't dispute that Cheonggyecheon is artificial, but he believes that the stream's real value is as a symbol of the direction in which Seoul is headed. "We've made people realize that quality of life is important," he says. "We've set a new standard not just for Seoul, but for Korea." It's a standard that the rest of Asia can learn from, as its cities slowly wake up to the costs of development. Kim Won Bae of KRIHS tells the story of visiting Shanghai and meeting a Chinese urban planner who had a burning question: how many 100-m-high or taller buildings did Seoul have? "I asked her why she asked that," he says. "She was still in the age of triumphalism. Seoul was once in that period as well, but we have passed it." Hong Kong, Beijing? Are you listening?
By Bryan Walsh
다시 태어난 서울의 청계천에서 3월의 매운 바람이 양복을 타고 부는 가운데, 얼 듯 차가운 물 속에 무릎까지 발을 담근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이라는 환경주의적 사업을 두고 고심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현대건설의 젊은 역군으로서 이 시장은 한때 오염되었던 청계천을 포장하고 그 위에 하루 168,000 대의 서울 중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수용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데 일조 했다. 청개천 복개 사업은 7,80년대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자회사 CEO로서 이 시장이 전국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어가며 추진했던 대규모 근대화 발전의 한 일환이었다. 이 시기에 그는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시장은 2002년 서울시장이 되어서도 계속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서였다.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그는 고가도로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내고, 물을 끌어올려 5.8km에 이르는 둑을 만들고 조경을 하여 서울 도심에 3억 6천 달러의 비용을 들여 물길을 만들었고, 지금 이른 아침의 한기를 물리치며 그 곳에 앉아있다. "물이 매우 차네요. 그러나 그것은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 시장은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린 소년 소녀들이 물 속에서 놀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보다도 공원의 수가 더 적을 정도로 오랫동안 무분별한 개발의 전형이었던 서울은 점점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다. 작년10월에 완공된 청계천 복원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는 1998년 이래로 3백3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일조했으며, 최근에는 2억 2천4백만 달러를 들여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 비견할 수 있는 서울숲을 도심 속에 조성했다. 첨단 기술의 깨끗한 대중교통이 자리잡으며 서울시민들은 차차 자가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삼성 그룹이 수집한 예술 작품을 바탕으로 세계적 건축가들이 설계한 스타일이 있는 박물관 리움을 비롯해 새로운 박물관들이 서울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고 있다. 또한 2002년에 그랬듯이 올 여름 한국의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시청 앞에 모인 수천만의 축구팬들은 서울광장이라 불리는 곳에 가지런히 단장되어 있는 잔디밭에서 한국 축구팀의 선전을 축하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6.25전쟁 이후 겨우 자립을 위해 부심하고 있을 때, 공원은 사치에 불과했다."라고 이시장은 말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발전과 환경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약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환경 쪽에 더 중점을 두려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서울의 녹지화는 단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만약 이 콘크리트 정글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 바뀔 수 있다면 베이징, 봄베이, 자카르타와 같이 더럽고 환경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는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도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한국의 수도가 보여준 사례는 서울과 함께 아시아의 사자로 불리는 홍콩에 특히나 의미하는 것이 클 것이다. 단시안적인 홍콩의 정치 지도자들은 환경이 지금과 같이 걱정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지도록 방치해왔다. "서울은 대도시라는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다" 라고 20년 간 홍콩과 한국을 오가며 지켜본 하와이 대학 도시계획전문가 Karl Kim은 말한다. "환경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해 분명 서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우리는 단지 기업활동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다."
토요일 오후 청계천에 사람들의 소요를 일으키는 걸 보면 이런 유명세를 타는 그들은 분명 영화배우나 축구선수임에 분명하다. 사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던진 빵 부스러기를 맞으며 복원된 청계천을 따라 유유히 헤엄치는 한 쌍의 청둥오리였다. 야생은 천천히 청계천으로 돌아오고 있으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또 무리를 지어 온다. 청계천 복원 이후 3개월간 청계천을 찾은 방문객 수는 천만에 이른다. 시청에서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는 청계천의 물은 도로보다 낮게 흐르고 있어 사람들에게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부터의 휴식을 가져다 준다. 근방 사무실 근무자들은 점심시간에 또 커플들은 데이트 삼아 폭포를 따라 떨어져 비좁은 징검다리를 지나 조선시대 다리의 돌기둥을 이용해 만든 광통교를 비롯해 22개의 다리 밑을 지나는 청계천 물길을 따라 걷는다. "제가 이 밑에 와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좋습니다."라고 정숙탁(59)씨는 광교 근처에 서서 말한다. "이 지역은 전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게 바뀔 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맑은 계곡물이라는 의미의 청계천은 1394년 조선시대 서울천도 이래 서울의 거울이었다. 조선왕조 시절에 청계천은 주로 빨래터로 아녀자들의 이야기 공간으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었었다. 그리고 1760년 정부는 지금의 청계천 모습을 이루기 시작했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2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청계천을 따라 돌로 된 둑을 쌓았다. 서울이 팽창함에 따라 청계천 둑을 따라 전쟁난민들이 판자촌을 형성하였고, 청계천의 물은 오염되어 한국전쟁 이후로는 개방된 하수처럼 변했다. 한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당국은 청계천 위에 환경이 치러야 할 비용에 상관없이 이루어진 빠른 근대화 물결의 상징인 고가도로를 세워 청계천을 가리는 데 바빴다. "고가도로 아래 지역은 더러웠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도 줄었다," "이 지역의 환경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었다." 라고 청계천 복원 후반기에 복원사업을 이끌었던 장석효 서울시 부시장은 말한다.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는 발상은 이명박 시장이 2002년 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 이전부터 도시개발 전문가들에 의해 구상되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이 시장은 3년 내에 고가도로를 제거하고 청계천을 다시 살리겠다고 확신에 찬 발표를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의심했다.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라고 Karl Kim은 말한다. "그럼 그 차들은 다 어디로 가나?"라고 말이다. 그러나 청계천 사업과 같은 녹지화 사업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 서울 시민들로부터 점점 더 지지를 받게 되었다. 자신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김원배 국토연구원(KRIHS) 원장은 "소득의 증가가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 몫을 했다."라면서도 그는 이러한 변화가 501명의 생명을 앗아간 1995년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재난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성장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제 서울 사람들은 삶을 즐기길 원하고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싶어한다. 그들은 '나는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등등.'이라고 말하고 싶어한다." 라고 그는 설명한다.
깨끗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에 대한 회의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홍콩과 같이 발전된 아시아의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만약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것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도시를 떠날 것임은 자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서울을 투자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나는 장기적으로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 시장은 말한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점점 첨단 기술로 나아가고 있으며 점점 매력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텔레콤과 영화산업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산업들은 한 때 한국을 대표하던 중공업보다 오염 생산이 적다. 한국의 정보화 기술에서의 경쟁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서울은 20억 달러를 들여 차세대 사무지구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를 난지도에 건설하고 있다. 월드컵 공원과 같이 값싸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에 매료되어 LG 텔레콤이나 팬텍과 같은 한국의 IT 기업들은 R&D 센터를 2010년 완공 예정인 DMC에 건설하고 있다. 이 DMC 에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빛이 더 밝아지는 스마트 스트릿 라이트와 같은 최신 가제트를 시현해 볼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기술들은 제작 중이나 처치 곤란한 첨단기술제품처럼 의심스럽게 들리나 홍콩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이보그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DMC는 완전히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국의 이미 활성화된 IT 분야에 약간의 활기만 더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DMC가 받는 압박은 그만큼 덜어진다. "일단 완공되면, DMC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서울시가 의도한 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서울시 DMC 담당관실의 강천호씨가 말한다. "결국 우리는 사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생각은 접어두자. 그러나 서울이 이렇게 활동적인 정부 없이 지금과 같이 녹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는 의심스럽다. 대중교통 시스템 개혁만큼 이런 면모가 두드러지는 곳도 없다. 거의 2백 8십만 대의 자가용이 있는 서울에서는 (홍콩의 600,000 대 미만에 비교했을 때), 교통 체증이 끔찍한 수준이다. 이 시장은 도로에서 자가용을 줄이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았으나, 서울의 잘 만들어진 지하철 시스템을 더욱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하철 트렉을 1킬로 더할 때마다 1억 달러가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청 직원들은 서울의 쇠락한 버스 체계에 눈을 돌려 좀 더 체계화되고 확장된 노선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74 km 의 버스전용중앙차선을 간선차로에 만들고 버스 시간을 지하철 시간과 맞추고 전체적인 서비스를 개선했다. 버스에는 GPS 센서를 장착하여 서울 어느 장소에 있든 교통상황실 직원들이 최첨단 통제실에서 버스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자동적으로 최대 효율을 위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즉 2004년 7월 1일부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결정했다. 처음에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새로운 스마트 카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승객들은 교통체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 버스 기사들은 새 노선을 모른 채 운행을 했다. "마치 지옥 같았다," 라고 도시철도공사의 음성직 사장은 말한다. 시민들은 분개했고 시장은 3일 후 사과성명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혁은 계속되었다. "나는 이것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이 시장은 말한다.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3개월이 지나자 버스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 줄어들던 버스탑승률은 다시 늘기 시작했다.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버스가 수 천대 더해졌고, 작년에 미국의 환경단체인 Environmental Defense and the Transport Research Board는 이 버스 개편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통 상(Sustainable Transport Award) 을 수여했다.
일각에서는 청계천이 도시의 생태에 대한 일개 개발가의 인공적인 생각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환경운동가들은 청계천을 '어항'이라고 부른다," 라고 환경운동연합의 이철재 씨는 말한다. 그는 "그냥 놔두면 물이 모두 말라버리기 때문에 청계천에 계속 물을 대려면 연간 2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청계천은 3천 6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어항이다." 라고 말한다. 건축가 김지애 씨는 청계천이 또 다른 이름의 초고속 개발에 불과하다고 활기찬 한국의 전통 거리인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며 말한다. "7,80년대에 이명박 시장은 거대한 개발을 주도했고 그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시장이 정말 인공적인 호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인사동의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와, 좁은 골목, 그리고 전통찻집들이 청계천으로 인해 만들어진 분위기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이 인공적이라는 사실에 반박하지 않지만, 그는 청계천의 실제 가치는 서울이 지향해야 할 방향만큼이나 상징적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는 단지 서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개발의 대가를 깨닫고 있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할 기준이다. 김원배(KRIHS)씨는 상하이를 방문하여 질문을 쏟아내던 한 중국의 도시계획자를 만난 이야기를 한다: 서울에는 100미터가 넘는 높이의 빌딩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녀는 물었고 저는 왜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물었다고 했다. "그녀는 여전히 성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 서울도 역시 그런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왔다." 라고 그는 말한다. 홍콩, 베이징, 듣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