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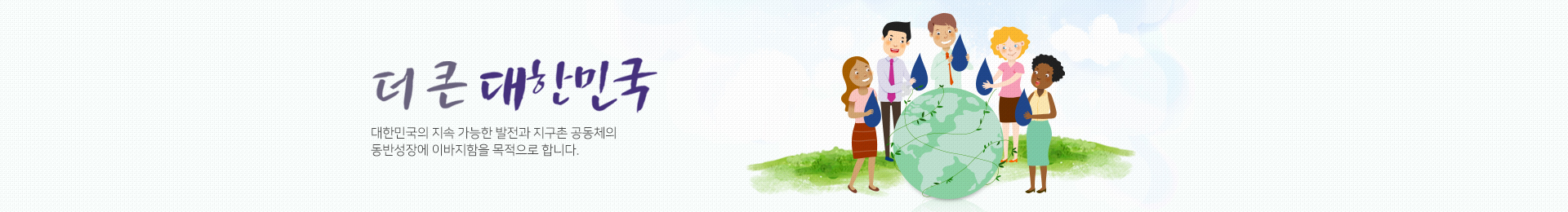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김상협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오스트리아의 다보스로 불리는 알벡에서 지난달 28~30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세계적 석학이 모인 국제회의가 열렸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세계를 선도해온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정권이 바뀐 뒤 사라진 듯해 `기이한(bizarre)`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별고문을 겸하고 있는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의 정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 사례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반면교사`가 된 셈인데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담당했던 필자로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난감한 처지에 빠지곤 한다.
지난 연말 역사적인 기후변화총회(COP21)가 열린 파리에서의 일이다. 주최국인 프랑스는 유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법을 제정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녹색성장법(Energy Transition Act for Green Growth)`이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간담회까지 마련하는 외교적 배려를 했는데 종주국인 한국에서는 고위직 누구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꺼리더라는 얘기를 전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한 교수는 "중견국 한국이 녹색성장을 통해 국가적 영향력을 제고한 사례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생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색해졌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어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하는 것이 정답일까? 사실 그게 또 애매해 더욱 곤혹스럽다. 예컨대 지난 정부가 만든 녹색성장기본법이나 배출권거래제는 아직 살아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나 녹색기후기금(GCF) 같은 국제기구도 여전히 한국에 있다.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뜯어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파리협정 이후 관련 기업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불편한 여건이 조성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녹색성장 담당 수석실이 아예 사라졌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실로 `격하`됐다. 그런가 하면 이전 정권에서 녹색성장에 봉직했던 공직자는 `변신`이 처세 수칙처럼 되었고 한국이 주도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갈수록 잊히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현 대통령이 취임 이래 한번도 녹색성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이 손꼽힌다. 이는 이전 정권과의 `단절 의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읽혔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정치제도나 정권의 특성이라 넘어간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국가 정책의 신뢰도와 결부 지으려 한다는 게 문제다.
색스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금본위제도가 폐기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지만 정권을 초월한 인선과 임기보장으로 고비를 넘기고 독립적 권위가 강화됐다"며 "지속성이 중요한 기후에너지 분야에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귀담아들을 조언이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처방이다. 이에 앞서 만약 이런 불신의 결과를 의도한 게 아니라면 100% 대한민국을 약속한 국가 지도자가 녹색성장을 녹색성장이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것도 국회의사당이나 유엔총회 같은 곳에서 말이다.
셰익스피어는 "장미는 장미라 불리지 않아도 그 향기가 계속된다면 여전히 장미일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장미는 여전히 장미라 불리고 있다. 우리가 독도를 독도라 불러야 하듯이 말이다. 이번 국제회의를 주관한 핵심 인사는 "한국 스마트폰이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만약 사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바뀌고 혁신의 동력이 흔들렸다면 과연 여기까지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달 초순 제주에서 GGG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유엔환경계획(UNEP) 4개 국제기구 합동으로 녹색성장 행사가 열린다. 녹색성장은 이미 국제언어가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낸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하겠는가? 공자가 정명(正名)을 역설한 까닭을 먼 이국에서 통감한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618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