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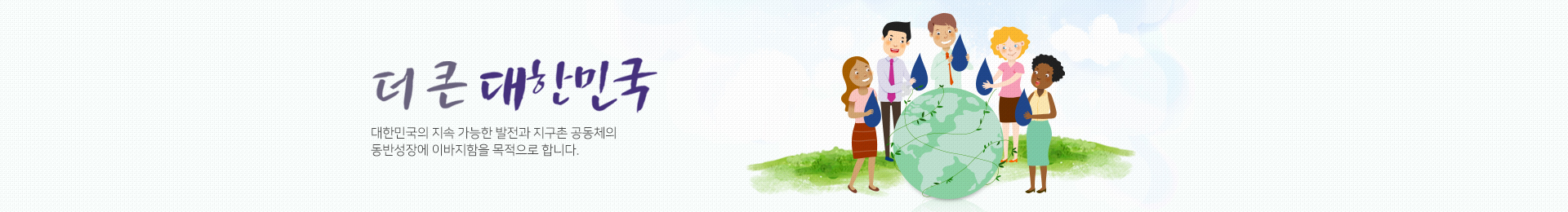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김상협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어쨌든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분다."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의 마지막 구절 `어쨌든 바람은 분다(anyway the wind blows)`가 떠오르는 이 말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들었다. 중국의 원자력 정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세션이었다. 그렇다. 지구의 자전과 공기의 열순환으로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저기압과 고기압 모두 강력한 힘으로 중국에서 부는 바람은 한국으로 밀려와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른바 편서풍(westerlies)이다. 중국의 동쪽에 사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연법칙이다. 그 바람에 무엇이 실려 오는지를 논외로 한다면 말이다.
미세먼지 쇼크를 겪고 있는 우리는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됐다. 자연법칙에 따른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중국의 산업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와 교통 문제가 만들어낸 인위적 요인 때문이다. 중국 수뇌부가 선언한 `스모그와의 전쟁`이 석탄 소비 감축, 자동차 증가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점만 봐도 이는 자명하다. 하지만 5년간 10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이 전쟁에서 한국을 고려한 정책은 민망할 만큼 찾기 어렵다. 우리 정부도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왜 그런 걸까?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손꼽는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규명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문제의 원인에 동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수순을 밟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해요." 협력을 이끌 메커니즘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상 전문가인 반기성 씨는 방사능 위협을 더 큰 문제로 경고한다. "중국은 현재 원전 13기에 27개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188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은 중국 동쪽 해안에 밀집해 있어요."
불편하지만 솔직해지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참극에 우리가 덤덤했던 것은 그 나라가 우리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서쪽 나라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처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지만 `초국경적` 문제는 개별 국가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동북아 협력을 촉진할 기제로 한·중·일의 `레짐 폴리틱스(regime politic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부터 살펴보자. 1966년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미국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설립에 성공한다. 명분은 아시아 역내국가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기실은 일본의 `뒷마당(backyard)`으로 여겨온 아시아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이었다.
중국은 그로부터 반세기 뒤인 2015년 시진핑 주석의 주도 아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했다. 명분은 급증하는 아시아 인프라 구축 수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지만 내심은 역내 패권국가로서의 화려한 컴백이었다.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을 깬 나라가 한국이다. 중견국(middle-power)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선진-개도국 18개국이 참여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설립과 더불어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에 성공했다.
특기할 점은 상이한 배경에서 출범한 이들 4개 국제기구가 모두 `녹색`으로 수렴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뤼춘 초대 AIIB 사무총장은 취임의 변으로 "고도로 녹색성장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케히코 나카오 ADB 총재는 "청정에너지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은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전략적 투자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손꼽았고, 이보 드 보어 GGGI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 최대한 손잡겠다"고 역설한다. 동상이몽으로 설립된 3국의 국제기구가 21세기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환경의 도전`에 서로 힘과 뜻을 모을 계기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연은 바람을 서에서 동으로 불게 하지만 인간은 협력의 구심을 찾을 수 있다면 지나친 희망일까. 어쨌든 이념과 진영을 넘어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게 다자간 레짐의 목적이다. 미래 세대에 지금처럼 빚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429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