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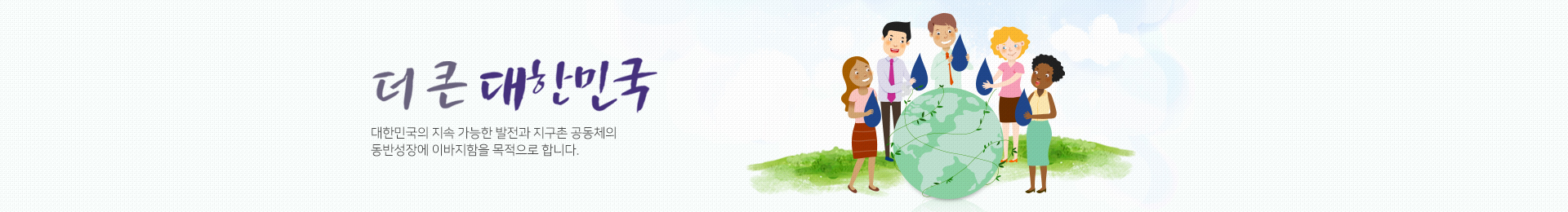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A(10)군은 매주 일요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에게 코딩 과외를 받는다. A군 학교는 지난해 교내 컴퓨터실에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 수십대를 설치하고 코딩 수업을 시작했다. 이 수업을 남들보다 낫게 하려면 과외가 필요했다. A군과 비슷한 초등학생이 많다보니 온라인에서는 “코딩 가르쳐줄 컴퓨터공학 전공자를 찾는다”는 학부모들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코딩 교육 열풍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코딩을 필수 교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했다. 하지만 초장부터 과외로 이어지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게임을 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게임을 만드는 아이로 키우자”고 역설한 이후 미국보다 한국에서 요란하다. 오바마의 연설에 이어서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초등학교 6학년때 코딩을 시작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극성 엄마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코딩 과외 열기가 달아오른다고 한다.
여기에다 이공계 취업문이 넓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고생들까지도 코딩과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코딩과외를 통해 이공계 적성을 길러 대학을 이공계로 진학해야 취직이 잘된다는 강박이 더해져서다. 코딩이란 컴퓨터가 인식하는 기계언어로 영어와 같은 컴퓨터 언어교육을 말하는데 이것을 학습하면 문제해결,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이른바 창의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게임과 휴대폰이 공기나 물처럼 흘러넘치는 상황을 잘 활용하면 게임중독 같은 부작용도 줄이면서 창의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1석2조의 효과도 노려 봄 직하다.
하지만 디지털혁명의 최신판인 코딩교육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풍토는 여전히 아날로그식인 것이 문제다.
남들보다 빨리 앞서 성취해야 한다는 결과만능주의 풍조와 방식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시대인 20세기 아날로그 시대에는 통했다. 불철주야로 열심히 따라하면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디지털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창의 자발 학습이어야 할 코딩을 과외로 속성재배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요령 외우기 중심으로 영어토플점수는 높아도 실전영어는 형편없었던 기성세대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딩 못지않게 창의학습을 내세웠던 논술 역시 요령과 외우기, 배끼기가 만연한 붕어빵식으로 논술학원만 창궐하고 수험생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코딩학습이 과외 과목 하나를 더 얹는 것이 되면 정말 타고난 창의인재들까지도 붕어빵 컴퓨터기술자로 얽어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식 조기과외로는 전문프로그래머 정도는 충분히 많이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력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포화상태이고 인도 같은 인건비가 싼 나라까지 생각하면 이미 한물간 ‘인재의 레드오션’이다.
“컴퓨터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직접 동생과 함께 만들고 싶었다”는 저커버그 말은 “함께 즐긴다”는 공동체의식과 “직접 만든다”는 도전과 모험정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저커버그의 사례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코딩 조기학습을 시작한 덕분에 페이스 북을 조기 창업하여, 세계 최연소(?) 재벌이 되었다”는 식의 아날로그 성공신화로 해석하면 ‘조기과외’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터이다.
저커버그가 코딩보다 더 일찍 고전을 얼마나 읽었는지에 대해선 모르고 알고싶어 하지도 않는다. 한국이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데 비해 19명이나 되는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생시절 인문학이나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도 없다.
코딩교육이 우리 사회가 목말라하는 창의인재의 산실이 되려면 창의인재의 본성에 대한 인식과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직접 해보는 호기심과 열정, 모험정신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즐기는 여유와 다른 사람과 나의 즐거움을 나눔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유익하고 공동선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습할 때 자연스럽게 창의인재가 되는 것이다.
<영남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