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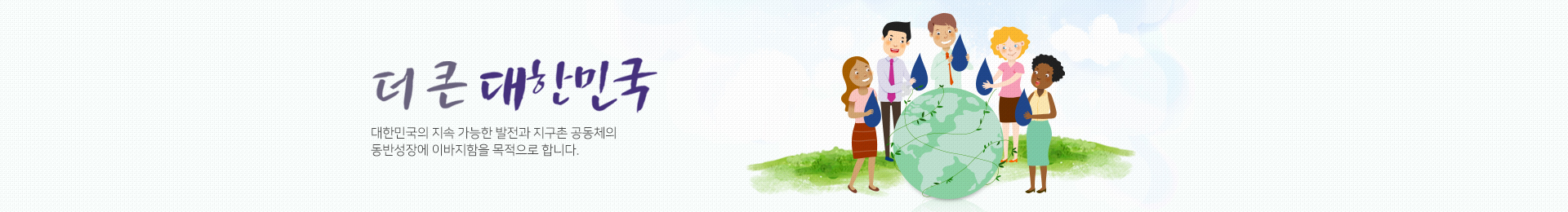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김대기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요즘 저성장이 화두인 것 같다. 5분기 연속 0%대 성장, 2분기 0.3%, 연율로는 1.2%에 그치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성장보다 일자리를 중요시하던 여론도 확 바뀌면서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 추경 편성 등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구조적인 저성장 모드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50대 이상뿐이다. 그것도 8년 후인 2023년까지고 이후부터는 60대 이상만 늘어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는 40대에 비해 소비가 54%밖에 되지 않는다. 은퇴를 시작한 680만명의 베이비부머도 앞으로 자기들이 30년 더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저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소비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최근 4년간 평균 소비성향이 5% 낮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더 추락할 것이다. 여기에다 현재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도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주택경기가 반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속되기 어렵다. 주택 구입 연령층은 세계적으로 비슷하다. 35~55세다. 이 연령대가 일본의 경우 1991년부터, 미국은 2008년부터 줄어들었다. 각각 장기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작과 일치한다. 우리는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주택경기 침체와 맥을 같이한다. 이 연령층이 향후 5년간 55만명, 10년간은 무려 1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대신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수요가 많지 않고 빚내서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내수가 여의치 않으면 믿을 것은 수출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역시 간단치 않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고 있어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지만 투자로는 연결되지 않고 자산 거품만 키우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아세안이 과거처럼 고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여러모로 살펴보면 불편하지만 저성장을 뉴노멀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분기 1%, 연율 4% 이상 성장은 어쩌다 기저효과로 반짝 달성될 수 있어도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한 숫자다. 분기 0%대 성장밖에 못한다고 안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저성장에 맞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저성장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빚이다. 과거에는 빚이 있어도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그 가치가 상쇄됐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는 다르다. 1~2% 금리를 우습게 알고 빚내다가 평생 고통이 될 수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빚을 경계해야 한다.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고졸 취업을 확대해 학자금대출을 줄이고, 주택 정책을 임대로 전환해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일을 막는 것과 같은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도 웬만큼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금리 인하나 추경이나 모두 빚이다.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다. 좁은 시장, 그것도 기업인을 존중하지 않는 국내에 머물러 있다가는 고생하기 십상이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해외로 진출한 자동차 업계나 종합상사들이 엔고 시절인 2011~2012년에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산업 공동화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노동과 서비스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번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정부·여당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740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