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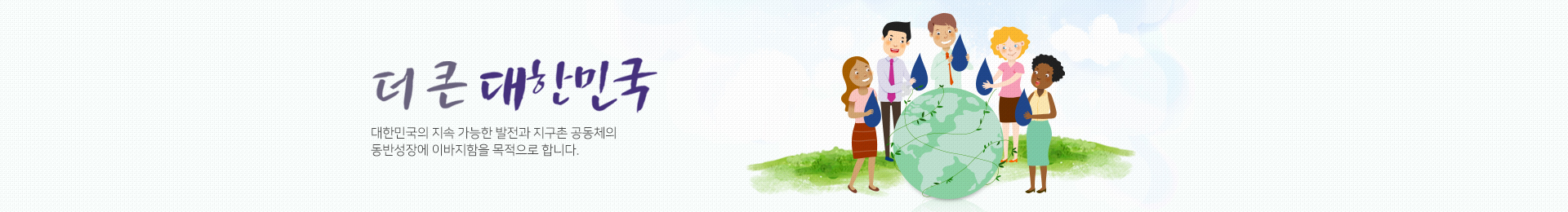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김도연 서울대 초빙교수
1만2천 인력의 과학기술 산실 출연연구소
리더십 강화, 연구경쟁 돋우고
정부 간섭 줄이는 혁신 필요해
아이작 뉴턴이 자연과학이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것은 1687년,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된 증기기관을 만들어 처음 사용한 것은 1776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00~300여년 전 서양에서는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61년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매사추세츠공과대(MIT)가 설립됐고 일본 도쿄제국대도 1876년에 공과대학을 열었다. 바다 저쪽에서는 이미 많은 젊은이가 현실을 다루는 엔지니어로 성장할 때 우리의 젊은이들은 아쉽게도 성리학(性理學)에 매진하고 있었다.
기술력은 곧 국력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사농공상(士農工商) 차별과 기술 경시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는 서러움까지 겪었다.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전쟁까지 치른 후의 대한민국 기술력이란 완전한 밑바닥이었다. 이처럼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었지만, 반세기 전에 시작된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은 참으로 눈부셨다.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인 1965년 5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 땅에 공업 발전을 위한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듬해 50여명의 소위 해외유치 과학기술자들이 모여서 발족한 것이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다.
그 후 KIST의 각 연구실은 기계, 전기, 화학 등과 같이 분야별로 20여개에 달하는 정부출연연구소로 독립했다. 그 결과 현재는 1만2000여명의 인력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한 해 4조50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초기 KIST의 한 해 예산이 10억원이었음을 상기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뿐이다.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도구만은 아니지만 여하튼 어떤 조사연구에 의하면 그간 KIST가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가 6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지난 반세기 동안 이들 연구소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이기에, 우리의 출연연구소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50년을 위해 이제는 새로운 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리더십 강화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이화학연구소는 세 명의 소장이 책임을 맡은 것에 비해 KIST는 모두 아홉 명의 원장이 일했으니, 연구의 생명인 미래를 지향하는 장기적 업무 추진은 어려웠을 것이다. 해당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탁월한 사람을 리더로 초빙해 적어도 5년간 일을 맡기고 그후 성과가 뚜렷하면 연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전 세계 어느 연구소에서도 연구원들이 조합을 결성해 경영에 관여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곳은 없을 것이다. 경쟁보다는 나눔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하는 한 연구소의 미래는 어둡다. 이는 연구원들의 복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기술인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사갈등의 늪을 연구소들이 가장 먼저 헤쳐 나오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연구소 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과제 설정과 연구비 배분을 모두 정부 부처가 주도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많은 연구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뒤쫓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끌고 있는 바, 정부 개입은 줄이고 연구에 대한 모든 업무는 연구자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KIST의 한 해 연구비는 약 2000억원에 달하는데, 우선 500억원 정도는 KIST 스스로 연구기획에서 집행까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소에서 멀어져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소들은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존재이며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연구소 스스로의 혁신이 절실하다.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668791&intyp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