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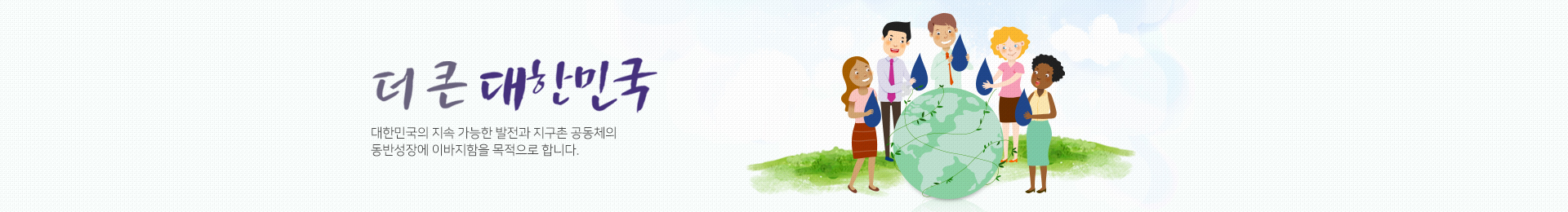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2010년 9월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400명의 미군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이라크 전쟁의 종전(終戰)을 선언했다. 공화당 출신인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네오콘 세력이 밀어붙인 7년 전쟁의 결과는 재앙에 가까웠다.
사상자도 엄청났지만 당초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발견되지도 않았고 중동정책은 이슬람 반군의 테러와 이라크 정정불안으로 그야말로 난마처럼 뒤엉켰다.
한국이라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 특검까지 벌여 관련자를 법정에 세울 만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나는 견해가 다르지만 조국에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을 의심할 수 없다"고 옹호했다.
이런 초당적 대처의 원조는 아서 반덴버그 상원의원(1884~1951)이다. 공화당 출신 상원외교위원장이던 그는 동서냉전이 시작된 1947년 해리 트루먼 민주당 행정부 외교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당파 정치는 물가에서 멈춰야 한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는 명언을 남겼다.
국가적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때만은 정파적 이해로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지 말자는 그의 말은 미국 의회 정치의 금과옥조로 돼 있다.
그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자이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마셜 정책, 한국전 참전 등 트루먼 행정부의 굵직한 대외개입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미국의 맹방인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때인 만큼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 부재와 외교적 무능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질 법했지만 존 매케인 상원의원(2008년 대선 후보),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 사람"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목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바마 1기 외교정책에 관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평가다.
`변혁(Change)`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오바마가 정작 부시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재미를 봤다는 분석이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권이 깔아놓은 드론공격 프로그램으로 알카에다를 궤멸시켜 지지율을 올렸고 취임 후 16개월 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전면 철수시키겠다는 공약을 질질 끌다가 3년이 다 돼 가는 2011년 말에야 이행했다. 고문 등으로 말썽이 많은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폐지 약속은 아예 백지화했다.
당쟁(黨爭)의 DNA가 유전자에 각인돼 있는 우리 정치문화를 미국 정치에 비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 친청(親淸), 친러, 친일세력으로 갈려 국가의 생명줄인 외교를 국내 정쟁에 끌어들였다가 망국(亡國)으로 치달았던 처절한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우가 돌고래가 됐다 해도 몸집 큰 범고래 입장에서는 `작은 생물`일 뿐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이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같은 중대한 안보 현안을 놓고도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이해 부족`(청와대)이니 `총체적 외교무능`(야당)이니 하는 소모적 정쟁만 벌이는 작금의 상황은 국난을 앞두고도 동서 당쟁에 매몰돼 다투는 KBS 드라마 징비록의 장면을 연상케 한다.
워싱턴의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리셉션룸에는 반덴버그 초상화가 걸려 있다. 이전투구에 바쁜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서로 `남 탓`하며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미국 국회의사당을 찾을 기회가 있을 때 그의 초상 아래에서 1분이라도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32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