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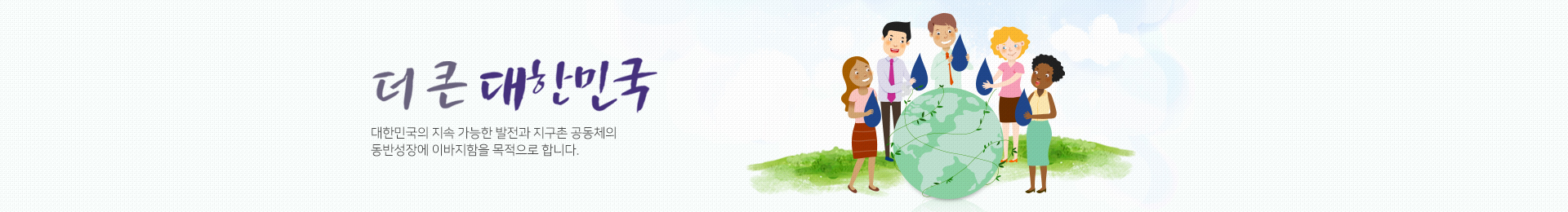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김대기 KDI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폐쇄회로(CC)TV 설치, 신고포상금 확대,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시험화 등등. 전형적으로 행정력에 의존하는 규제형 대책이다.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소수의 저질 교사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부작용 또한 작지 않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대책들은 초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이 좋은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힘을 받는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있다. 국공립을 30%까지 늘리더라도 나머지 70%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수조 원의 예산과 공공기관이 갖는 태생적인 비효율과 낭비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 아마도 경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4만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할 필요 없이 잘못하는 시설은 스스로 도태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는 영유아보육기본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그러다 보니 강남이나 강북이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보육료가 동일하다. 가격이 묶여 있으니 경쟁은 애초에 불가능이다.
둘째, 2012년부터 무상보육 확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을 초과했다. 초과 수요 상황에서는 경쟁이 무의미하다. 어린이집들은 보육료마저 국가에서 받으니까 굳이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보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다.
사실 보육제도를 처음 도입하던 시기에 정부가 경쟁 방안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보육예산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던 2005년도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료 자율화가 논의됐다. 보육료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시설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대신 국가 지원은 못 받는다.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종전대로 상한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육시설을 다양화하면 수요에 맞게 민간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수요자들이 장기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민간에서 시설 건립이 활성화함으로써 절감되는 정부 예산은 저소득층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진보진영의 형평 논리에 의해 부결됐다. 가격이 자율화되면 고급 시설이 생기고, 고급 시설이 생기면 저소득 계층의 박탈감이 커진다는 이유였다. 결국 보육료 상한제도는 유지됐고 경쟁은 사라졌다. 모든 보육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끌고 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모두 지원을 받게 됐다.
이후 정부는 경쟁을 통하지 않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했다. 보육교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봤고, 수요자들이 직접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도 도입해봤다. 그러나 지원금은 대부분 원장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수요 초과 상황에서 바우처제도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평가하기까지 이르렀다.
전담기관까지 만들며 분투했지만 4만개가 넘는 보육시설과 30만명에 이르는 교직원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겠지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아마 진보진영의 반대로 안될 것이다. 시장을 무시하고 형평 논리에 사로잡히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서비스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형평의 끝은 하향 평준화이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없는 형평 논리에 서비스산업은 정체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 이제 진보든 보수든 합리적이어야 한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128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