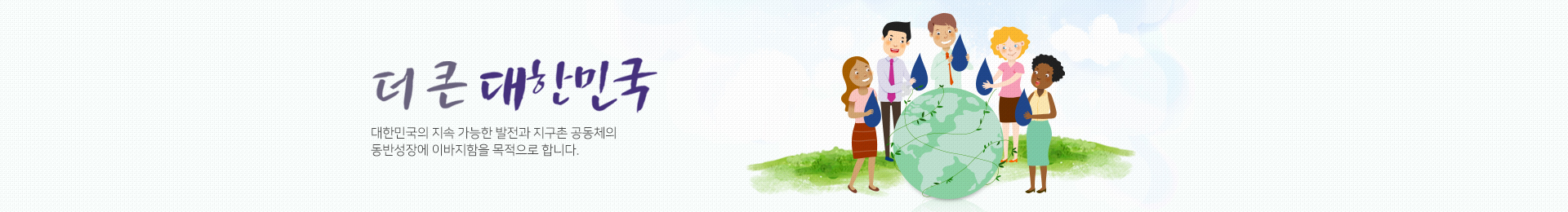20년간 이렇다 할 산업정책 없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산업 육성'
미국 경제성장론 교과서에서 한국의 산업정책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6·25전쟁 이후 이렇다 할 기반도 없이 시작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한국은 1960~1970년대 고도성장을 경험했고, 1980년대에는 3저 호황을 만나 명실상부 신흥공업국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지금도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기계, 방산 산업 등도 이 시기에 토대가 마련됐다. 이런 눈부신 성과에 대해서 경제학자 앨리스 암스덴은 한국을 일본에 이은 ‘아시아의 다음 거인’이라고 칭송했다.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등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산업정책의 성공과 그에 따른 기업의 성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크게 나아졌다.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이 성공하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 국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법인세수 증가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열악했던 사회 인프라와 복지 수준도 대폭 개선됐다. 마이카와 아파트 시대가 열렸고,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다. 산업정책과 자유시장이 만나 생산된 부가 국민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민생 개선의 거시경제적 과정이었다.
그런데 약 20년 전부터 산업정책은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정보기술(IT)산업 육성정책을 제외하고는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산업정책은 사라졌다. 대신 연구개발(R&D) 지원 등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산업정책이 대세를 이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을 밀어주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미덕으로 여겨졌다.
여기에 더해 ‘소득주도성장’처럼 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들까지 남발되면서 산업정책의 성공 교과서로서 한국의 위상은 유명무실해졌다. 지금 우리가 국가 핵심 산업이라고 애지중지하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은 정부의 정책 지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투자해 이룬 성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세계 각국은 산업정책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정부 개입을 자제했던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및 과학법’ 등을 통해 자국의 첨단산업을 대놓고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점점 덩치를 키우며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밀린다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판단에서일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정학적 위기와 그에 따른 국제통상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필자는 최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全)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한 대통령의 발언을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해한다. 혹자는 회의에 민생은 없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산업정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민생정책이다. 지난 2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산업정책 선두주자로서의 DNA를 부활시키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격동의 시기를 기업과 협력해 잘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민생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더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