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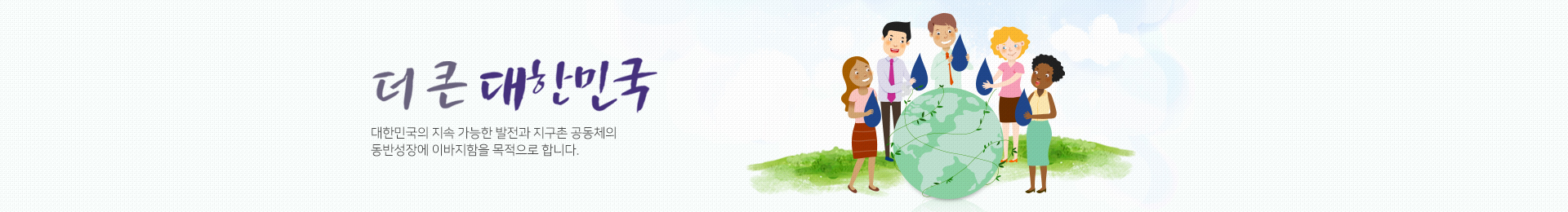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4월 총선이 끝나면 정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선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려면,
이번 총선부터 유권자가 공약의 대차대조표를 꼼꼼히 따지고
표심을 겨냥한 오염된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경제의 밑바탕(제도)과 꼭짓점(리더십)에 모두 정치가 있다. 동서고금의 각국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로마제국은 복지확대와 정부 씀씀이 급증에 따른 부담을 줄여보려는 인플레이션이 멸망을 재촉했다. 명(明)나라는 환관의 발호와 해금(海禁)정책 등 관료 의 무사안일 때문에 혁신이 사라지고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필리핀은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GDP)이 높았지만, 40년 넘게 ‘하위 중소득 (lower-middle income)’ 국가로 머물러 있다. 21 년 집권한 마르코스정부의 무모한 공공투자와 만연한 부패가 나라 빚을 크게 늘려 경제가 어려워졌다. 1949년 ‘농지개혁’으로 농민의 생산의지와 교육열에 불씨를 지핀 우리와 달리 필리핀은 토지 소유의 편중 구조도 바로잡지 못했다.
19세기에 이미 중진국 반열에 올랐던 아르헨티나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1946년 집권한 페론 대통령 부부는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처우개선 등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두고두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 끝내 2001년 디폴트 사태를 맞았다. 그리스는 우리보다 16년 앞선 1972년 ‘상위 중소득’ 국가가 됐으나, 1981년 사회당 집권 이후 과당복지경쟁과 유로존 편입으로 어려움을 겪더니 2015년 디폴트에 이르렀다. 지난해 긴축에 반대하던 시리자 (Syriza)당이 정권을 잡자 전문가와 부유층 20만여 명이 이민을 떠나는 이른바 ‘컬리(Curley) 효과’ 등으로 상황은 좀체 반전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이 1990년대 초부 터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은 정치 난맥상과 궤를 같 이 한다. 거품 붕괴 후 일본경제는 고령화 등으로 ‘투자-저축곡선’ 기울기가 가팔라져 재정정책 효과가 급락했다. 그런데도 혁신은 게을리한 채 정치권이 주도한 재정팽창과 감세만 반복했다. 지난 20년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3배 넘게 뛰었고, 수상이나 장관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바뀌기 일쑤였다.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예단할 순 없지만, 최근 주요국 경제성과도 정치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는 것 같다. 영국·독일·인도·멕시코·일본의 상대적 선전과 브라질·터키·태국의 부진이 그 방증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1980년 우리 경제의 역성장은 2차 오일쇼크 탓도 있지만, 1979년 이후 정정불안의 영향이 컸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와 노동법제의 개혁, 기아자동차 해법 등을 미룬 채 권력다툼에 바빴던 정치권도 외환위기의 장본인에 속한다.
4월 총선이 끝나면 정국은 대선 가도로 빠르게 옮겨가게 된다. 정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아마도 반(反)시장규제와 함께 정치 입김을 늘리는 대증요법과 날림정책이 활개를 치는 한편, 인기 없는 구조개혁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려면, 이번 총 선부터 유권자가 공약의 대차대조표를 꼼꼼히 따지 고 표심을 겨냥한 오염된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
<나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eiec.kdi.re.kr/nara/contents/nara_view.jsp?fcode=00002000040000100012&idx=10473&pg=1&pp=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