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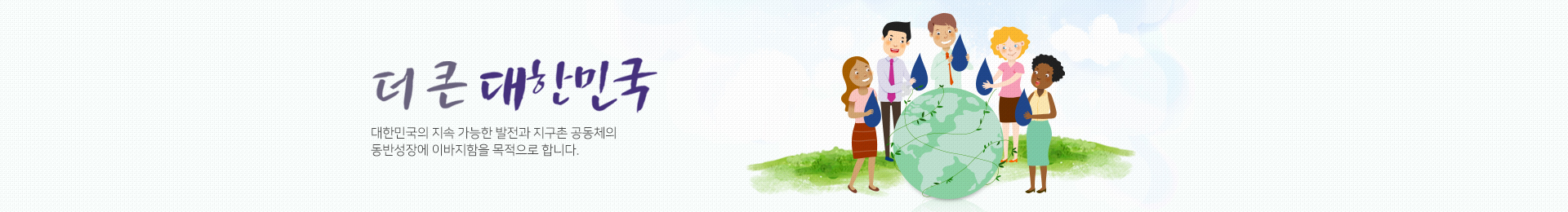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파리 기후협약의 이름
이번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21)의 최종 결과물은 어떤 법률적 성격 또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전력이 있는 미국은 얼마 전 존 케리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파리 총회의 결과물이 조약(treaty) 같은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법률적 속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당장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으로부터 “그럼 무얼 하자는 거냐”는 반박을 받을 만큼 세계는 시끄러워졌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일 오후(현지시각) 파리 총회장 미국관에서 라이브 스트림방식으로 진행된 존 케리의 연설현장에는 각국에서 온 인사들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넘쳐났다.
존 케리는 이날 뜻밖에도 ‘법률적으로 구속 가능한 협정(legally binding agreement)’을 환영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존 케리는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서 보다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대(high ambition coalition)가 나타났다”며 “미국은 야심적이고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협정(ambitious, inclusive and durable global agreement)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케리는 이와 더불어 “각국이 처한 상황(national circumstance)과 역량(respective capability)에 따른 ‘유연성(flexibility)도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얼핏 들으면 말장난과도 같은 이 표현에는 사실 미국의 깊은 고민과 선택이 담겨 있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각) 파리 COP 21 총회장 미국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공화당은 기후변화 회의론자 또는 부정론자로 가득 차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 총회의 결과물로 조약 비슷한 걸 가져오면 의회에서 이를 비준해 줄 리가 없다. 케리 국무장관이 파리에 오기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국제법적 속박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을 밝힌 배경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글로벌 협정’을 지지한다고 한 건 또 뭘까. 케리 장관은 45분간에 걸친 이번 파리 연설에서 탄소를 오염물질로 규정하는 ‘카본 폴루션(carbon pollution)’ 이란 용어를 수차례 사용했다. 조홍식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에 대해 “미 의회가 아니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파리 총회 결과물을 이행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미국에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이란 게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탄소는 오염물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각 주에 전력생산을 할 때 탄소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명령한 근거도 여기에 있다.
존 케리의 이날 표현에 따르자면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와 같은 국제법적 조약이 이번 파리총회에서 채택되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유연한 협정(flexible agreement)’으로 귀결되면 미국 국내법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이 커진다.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전문가들도 필자의 이런 해석에 동의했다. 파리에서 만난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협상 문안의 변경 과정과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미국의 이런 고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신 기후체제를 출범시키자고 합의하며 그 성격을 의정서(protocol), 법률적 장치(legal instrument), 법률적 효력을 갖춘 합의된 결과(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중 하나로 하자고 문을 열어둔 것도 알고 보면 같은 맥락이다.
중국이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사실 국제법적 구속을 싫어한다. 한국도 내심 그런 모양이다. 지난 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및 총회가 유럽연합(EU) 주도로 획일적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후체제를 추구한 바람에 실패로 돌아간 것도 참고할 만하다.
그래서 이번 파리총회의 최종 결과물은 ‘파리 의정서(Paris Protocol)’가 아니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불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것도 각자가 국내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어떻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 기후체제는 이번 파리총회를 통해 그 출범의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성격은 국제적 구속력을 갖추는 쪽으로 강화될 것이지만 말이다.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1/201512110260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