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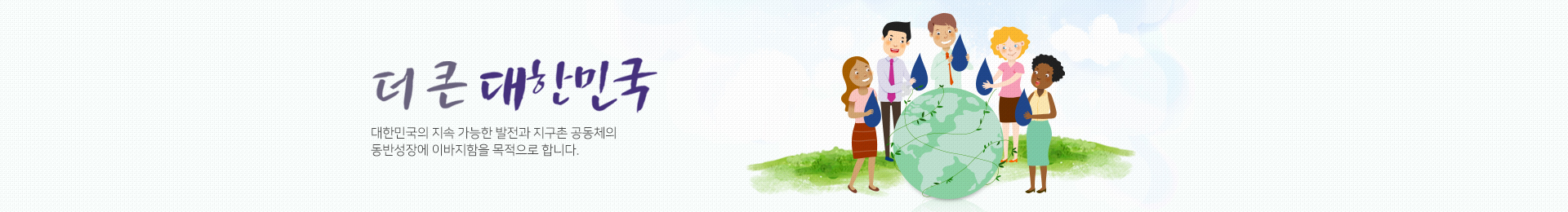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이동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총장
필자는 최근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YS) 말기 청와대 출입기자를, 이명박 대통령(MB) 때는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며 청와대를 안과 밖에서 관찰·경험할 수 있었다. 그 결론은 `국정의 80%는 연속된다`는 것이다.
MB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만들었던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앤 일이 있다. 실제 현대사회의 국가운영이 정부-시장-시민사회 3개의 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이 절실한데도 당시 이를 없앤 데는 노무현 청와대의 `상징적 브랜드`였던 만큼 이를 지우겠다는 암묵적 의도도 작용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결국 임기 중반 사회통합수석실이란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U턴`의 이유는 진보·보수의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 문화 학술 등 각종 시민사회 그룹과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각성 때문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쇠고기 협상이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은 전임 정부가 벌인 일을 MB정부가 `설거지`하거나 마무리 지은 것이었다. 정권을 넘는 국가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예외 없이 "5년 단임제는 안 되겠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1년은 터 닦고 2~3년 정신없이 뛰다보면 대선 정국에 들어서 레임덕에 빠진다"는 푸념이었다. 해결책은 사실 간단하다.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주식회사`에 필요한 과제를 승계, 발전시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의 `색깔 지우기`는 정권이 교체되든, 재창출되든 한국 정치의 패턴으로 정착돼가는 느낌이다. 야당은 고사하고 현 정부 감사원까지 나서 `4대강 살리기`를 비판하며 전임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몰아갔던 일만 해도 그렇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효용성이 뒤늦게 입증되자 도수로 공사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등 호들갑을 떠는 와중에도 관계부처 회의에서 4대강이란 `금기어(禁忌語)`를 피하느라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일일이 열거했다니 정치코미디에 등장할 만한 얘기다.
이달 초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대한민국 브랜드로 국제사회에 각인된 `녹색성장(Green Growth)`의 비전을 강조했더라면 어젠더를 주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초대 이사장을 지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MB정부가 시작했더라도 녹색성장이 미래의 화두인 만큼 국가정책 브랜드로 승계, 발전시키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한국은 당초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규모로 평가받았던 녹색기후기금(GCF)까지 유치했지만 우리가 방치하는 동안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서 덴마크가 주도하는 어젠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전 정권의 적폐(積弊)로 치부되고 있는 자원외교도 이제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재가동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바닥을 치고 셰일가스 광구 등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지금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몇 년 뒤 땅을 치며 후회할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 브랜드가 됐건, 인재 풀이 됐건 5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을 `초기화`하는 단절과 청산의 역사가 계속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곧 임기 4년차에 들어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최대 과업도 어쩌면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다.
권력은 5년 만에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1176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