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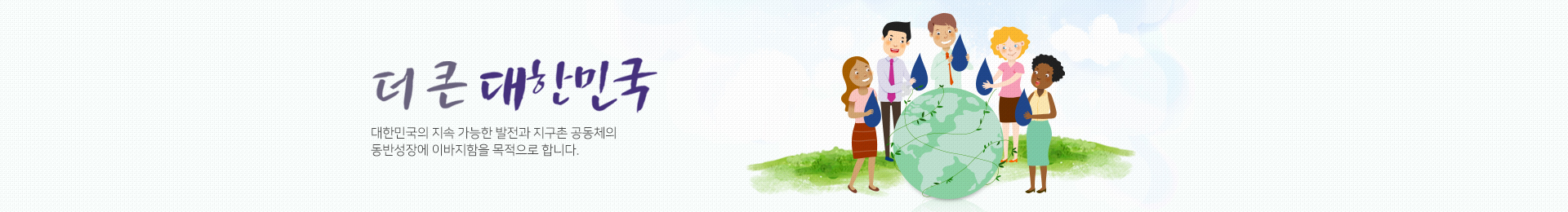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이동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총장
한때 `일국(一國)의 총리`란 말이 인구에 회자된 일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새로 임명된 강영훈 총리는 TK(대구·경북) 출신 실세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각하의 뜻`이라며 끼어드는 것은 물론 전화로 `훈수`까지 하자 "비서가 감히 일국의 총리에게…"라며 호통을 쳤다. 소문이 저잣거리에 퍼지면서 이 표현이 덩달아 화제가 됐다.
2년10일을 봉직한 뒤 "너무 나이를 먹었다"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깔끔한 처신까지 어우러져 이 일화는 `명망가형 재상`으로 강 전 총리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시대가 변하면 공직에 요구되는 스펙도 바뀌게 마련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가 남아 있던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정권의 정통성 콤플렉스는 사라졌다. `얼굴마담`으로서 총리의 필요성이 반감된 셈이다.
반면 `더 큰 대한민국`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형 국정 운영만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점점 어렵게 됐다. 단순 통계로도 1988년 4400달러 수준이던 1인당 국민소득(GDP)은 지난해 2만8400달러로 얼추 잡아도 6배 이상 늘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만 53개국으로 세계 시장의 73%를 차지한다.
또 대통령이 꼭 참석해야 할 국제회의만 1년에 7~8개에 이른다. 여기에다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고난도 과제와 복잡다단한 남북 관계에까지 이르면 더 이상 `내수형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패러다임도 `통치에서 경영`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총리의 개념도 이에 맞춰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다.
과거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 유형으로 `구단주와 감독`(이해찬 총리), `몽돌과 받침대`(고건 총리) 등 조어가 나온 적도 있다. 그러나 시대 변화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직무 특성을 놓고 본다면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한 총리의 정확한 스펙은 `교감(校監)형`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을 대신해 궂은일을 처리한다. 필요하면 교사들 군기 잡는 악역(惡役)도 마다하지 않는다. 몇 학년, 몇 반 교실에 쓰레받기 빗자루가 몇 개 있는지 알 만큼 디테일에 밝다. 전공에 뛰어나면 더욱 좋다. 다만 앞장서서 설치지 않고 일이 되도록 뒤에서 돕는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대권형 총리`야말로 총리직을 둘러싼 오해와 착시(錯視)의 대표적인 예다. 우선 총리직은 대권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대통령중심제에서 2인자인 국무총리 직무는 발광체가 아니라 달처럼 햇빛을 비추는 반사체일 뿐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대권형 총리가 단명(短命)에 그친 것이나 대통령이 된 사례가 전무한 것도 대통령과 총리는 스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대권형으로 분류되는 순간부터 견제의 표적이 되거나 이완구 총리의 경우처럼 과속하다가 낙마하기 십상이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해도 오죽하면 대통령제 본산인 미국에서도 부통령 자리는 `대통령의 장례식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조롱이 따라다닌다. 실제 20세기 이후 대통령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를 빼고 현직 부통령을 마친 직후 바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 한 사람뿐이다.
그만큼 해와 달은 다른 것이란 인식이 미국 대중에도 암묵적으로 각인돼 있는 것 아닐까.
신상털기로 변질된 청문회를 통과할 44대 총리감을 찾는 일은 지난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사람에 총리 자리를 꿰맞추기보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필요한 스펙을 정한 뒤 적임자를 물색해 보면 어떨까. 어차피 적임자가 아닌 바에야 있으나 마나한 상처투성이 총리 자리를 비워놓은들 어떠랴 싶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445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