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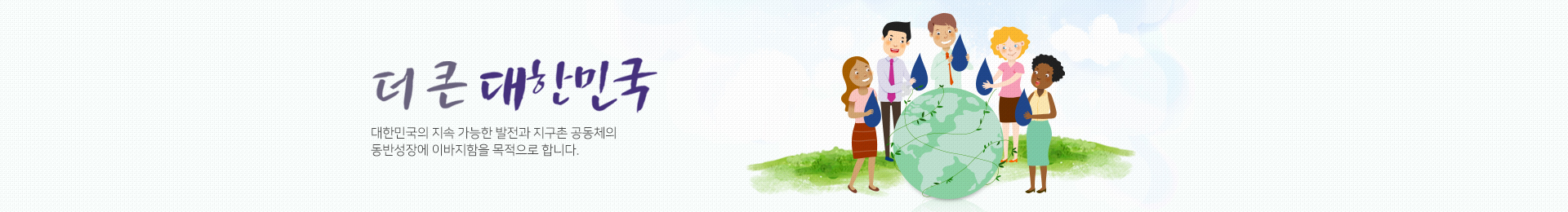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총장
KBS의 주말 사극 드라마 ‘징비록’이 장안의 화제다. 임진왜란이란 국난을 목전에 두고도 동인-서인 간의 당쟁(黨爭)에 골몰했던 420여 년 전의 조선과 21세기 대한민국 정치판이 너무 닮은 꼴인 탓일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이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데도 무한정쟁에 매몰돼 있는 것이 작금의 여의도 정치의 실상이고 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현상이다.
하긴 대통령이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를 겨냥해 “불어터진 국수 먹는 한국경제가 불쌍하다”고 비난하고 여기에 즉각 여당이 가세하자 ‘유체이탈화법’이라고 야당이 대거리하는 극한 대치를 보면 주역만 바뀌었을 뿐 조선 당쟁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몇 년 전 교수들이 사자성어로 채택했던 당동벌이(黨同伐異·같은 패거리는 무조건 편들고 반대편은 공격하는 행태) 그대로다.
동서 분당으로 본격 발화(發火)한 조선 당쟁사에서 필자의 뇌리에 가장 뚜렷이 남아 있는 대목은 율곡 이이(1536~1584)가 선비의 최고 영예인 문묘(文廟)에 모셔졌다가 쫓겨나는 소동 끝에 110년 만에 정식으로 종사(從祀)된 사건이다. 요새로 치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가 서훈을 삭탈당하고 쫓겨나는 곤욕을 치른 셈이다. 율곡은 생전에 당쟁 가능성을 걱정하며 중재 노력까지 기울였지만 서인의 정신적인 지주라는 이유로 동인과 그 후예인 남인 세력은 그의 사후 율곡의 문묘 종사에 결사반대했다. 더구나 이덕일 교수의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에 따르면 그 표면적인 반대 이유가 “모친인 신사임당 사후 불교에 한때 귀의했었기 때문에 정통 유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니 어처구니없기까지 하다.
이른바 진보를 자칭하는 인사들이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공칠과삼(功七過三)’은 고사하고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며 끌어내리기에 목청 돋우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나마 조선 당쟁은 학맥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지역감정의 색채는 별로 없었다. 몇 년 전 전남 해남의 고산 윤선도 고택을 방문했다가 같은 남인인 징비록의 저자 서애 류성룡은 물론 퇴계 이황(두 집안 다 경북 안동)의 종손들과 1년에 몇 차례씩 만나 교유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문제는 오늘 여야 정쟁에는 지역주의 망령까지 어른거린다는 점이다. 충청 출신인 이완구 총리의 청문회에 앞서 야당 대표가 ‘호남총리론’을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은 뒤 충청 출신 야당의원들이 아예 청문위원을 고사한 것이나 이 후보 측 증인으로 나온 충청향우회장이 “왜 호남분만 계속 질문하느냐”고 받아친 뒤 충청 여론이 급반전했다는 조사결과는 소극(笑劇)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심각하다. 그렇지 않아도 특정 지역 출신이 장관에 지명되면 야당이 너그럽게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 여의도 정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때마침 최근 중앙선관위원회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린 뒤 권역별 정당명부와 석패율(惜敗率) 제도를 도입하자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상대 강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예상대로 여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의석이 사라질지 모르는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 벽에 가로막힌 탓이다. 20여 년 전부터 단속적으로 제기됐던 망국적인 지역 대립 해소방안은 이번에도 결국 반짝 관심에 그치고 말 조짐이다.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는 과연 조선 당쟁보다 건강한가?
이미 ‘내 편의 주장은 무조건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극단적 진영논리에 함몰돼 있는 데다 지역주의 덫에까지 걸려 있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194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