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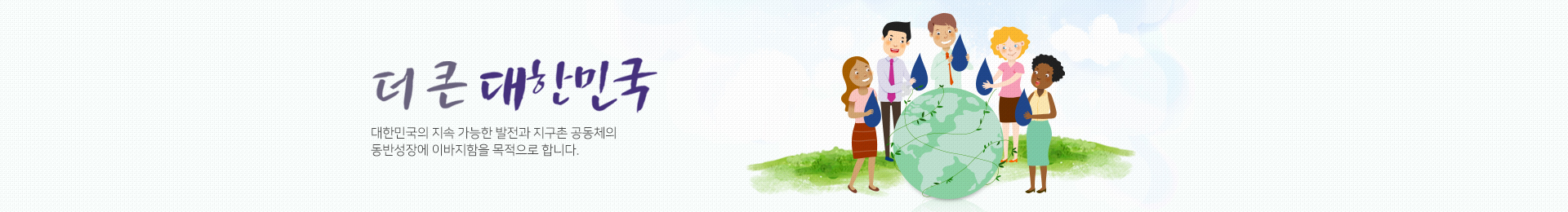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이동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총장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가 확정된 뒤 조지 W 부시 당선자는 선거 참모였던 애리 플라이셔에게 백악관 대변인 지명을 통보하면서 당신은 ‘나라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온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게 된 만큼 메시지 관리를 신중하게 하라는 주문이자 깊은 신뢰의 표시였다. 2년 반 동안 새벽 5시에 출근해 24시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격무를 마친 뒤 플라이셔는 “인정받았기에 해낼 수 있었다. 나는 행운아”라고 말했다.
1970년 12월 안동 도산서원 복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 헬기에 탄 박정희 대통령은 봉황 휘장이 새겨진 본인 자리를 박종홍 교육문화특보에게 양보했다.
그 얼마 전 박씨는 상근 특보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밤새 일하고 늦게 일어나는 교수 시절 습관이 몸에 배 청와대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고사했다. 그러나 “사무실에 안 나와도 되고 필요하면 전화나 편지로 전하면 된다”는 박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에 특보직을 맡았다. 극진한 예우에 감동한 그는 정시 출퇴근하며 정신문화연구원 설립 등을 위해 일하다 6년 뒤 과로가 겹쳐 숨졌다.
필자 역시 유사한 일을 겪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으로 일하던 2009년 1월 초 ‘대형 사고’를 쳤다. 연말부터 퍼진 개각설에 연일 “확정된 바 없다”고 판박이 응대를 하던 끝에 “설 전엔 개각 없다”고 질러버린 것이다. 정작 발칵 뒤집힌 것은 철통보안 속에 2~3일 뒤 개각 발표를 준비하던 청와대 내부였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각 발표를 한 뒤 기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겠다”고 자수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변인 말이 신뢰를 잃어선 안 된다”며 개각 발표를 한 주일 늦췄다. 나는 그 후 더 열심히 일했고 대상포진까지 걸렸다.
국내외 미담(美談)만 늘어놓은 셈이 됐지만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참모 관계에 관한 한 우리 정치사에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사례가 더 많다.
YS정권 말기 청와대 출입기자이던 필자에게 하루는 모 장관이 “대통령에게는 장관이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한 존재”라고 푸념했다. 걸핏하면 터지는 게이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단명(短命) 신세인 데다 그나마 경질 소식을 이동 중 차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접하는 ‘비참한 상황’을 에둘러 말한 것이었다.
데자뷔를 보듯 이런 장면은 지난 2년 동안에도 적지 않았다. 무슨 ‘괘씸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후임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러시아 출장 중 경질된 일이나, 친박 핵심이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와 정책 갈등 때문에 ‘업무 거부’를 하다가 사표를 낸 사태에 대해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이 많다. 특히 친박 장관이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한 게 한 달 이상 묵살됐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말 염려할 일이다.
궁정(宮庭) 문화가 DNA에 각인돼 있는 탓일까. 역대 대부분 대통령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에 대해 ‘나 덕분에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처럼 비친다. ‘발톱에 낀 때’라는 푸념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연원은 이 언저리 아닐까 싶다.
하지만 장관이든 수석이든 채찍은 참모들을 ‘알아서 기게’ 하지만 ‘알아서 뛰게’ 하는 것은 신뢰와 격려다. 개각이나 특보단 신설 등으로 분위기 쇄신을 하는 일 못지않게 대통령의 인재관과 운용의 묘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꽃이라면 참모는 그 꽃을 떠받치는 꽃받침이다. 꽃받침이 튼실하지 못한데 꽃이 제대로 피어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참모가 바로 자신을 떠받치는 존재요 얼굴이란 생각으로 애중(愛重)히 대할 때 국정도 더욱 활짝 피어나지 않을까 싶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8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