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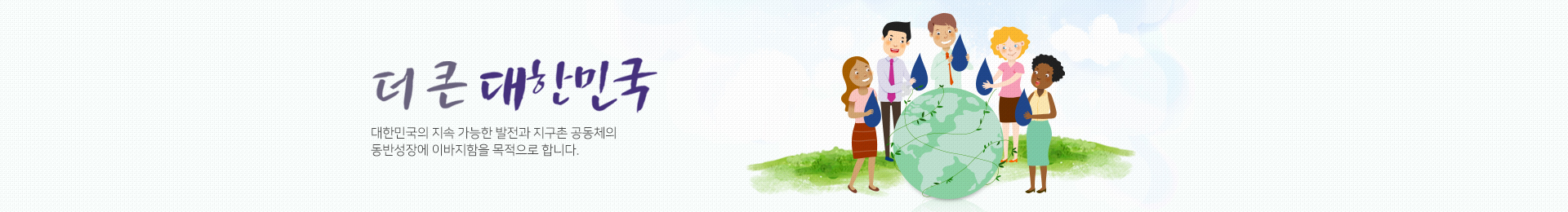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이동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총장
역사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조선 숙종은 재위 13년째인 1687년 5월 왕실 인척인 조사석을 우의정에 임명했다. 그런데 중신들에게 추천을 의뢰했던 숙종은 다섯 명이나 퇴짜를 놓은 끝에 “조사석은 어떠냐”고 뒤늦게 내심을 밝혔다. 그러자 즉각 유언(流言·루머)이 퍼졌다.
내용은 조사석이 장희빈 쪽에 줄을 댄 것을 감추려고 왕이 ‘꼼수’를 썼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조사석과 장희빈 어미 윤씨가 내연관계였다”는 악의적인 루머까지 나돌았다. 격노한 숙종이 발본색원해 엄단할 것을 명하자 어느 날 원로 대신 김만중이 나섰다.
그는 숙종 면전에서 “옛날에도 왕이 총애하는 후궁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유언이 퍼졌다. 유언을 단속하기에 앞서 수신제가(修身齊家)에 더 힘쓰시라. 세상은 다 아는데 주상만 모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바로 귀양을 갔고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을 지었다.
327년 전 벌어진 왕조시대 일이지만 마치 세월을 건너뛰어 작금의 정국 상황을 리메이크한 듯한 장면이다. 말 그대로 데자뷔(기시감)다. 문제는 숙종이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인(장희빈 편)·서인(인현왕후 편) 간 당쟁까지 뒤얽혀 이 악성 루머가 결코 근절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실록에까지 올라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판박이 상황이다. ‘정윤회 문건’을 작성·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가 구속되고 “지라시에 나라가 흔들려선 안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에 아랑곳없이 ‘문고리 3인방’과 ‘그림자 실세’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데도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거나 ‘국정 농단 있었다’는 의견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를 넘으니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칠세라 마음이 급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얼마나 속상할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김만중의 돌직구 진언(進言)처럼 루머란 본래 민초들이 그럼직하다고 믿는 정황과 심증(心證) 때문에 퍼지는 것이다. 법적 대응에 앞서 정무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과정은 오리무중인 채 블랙박스에서 튀어나오듯 중요 인선이 이뤄지고 선거 때 비대위원을 지냈던 사람이나 전직 장관들 입에서 ‘비선 실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판인데도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란 말로 시종하니 의혹이 불식될 리 없다.
근원적 해법은 시스템에 의한 의사 결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뿐이다. 더욱이 문고리 권력이란 어느 정권에나 있는 권력 현상이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만나는 미국에서도 대통령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닉슨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조차 “누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가 권력이다. 특히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것은 위원회 의장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수석비서관들마저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가 없다는데 “문고리 권력은 없다”고 강변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각료, 참모 간에 거리가 없도록 소통의 문을 열어젖히면 될 일이다.
청와대뿐이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최근 임원들을 모아놓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되도록 제대로 보고받은 일이 없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 있는 대로 보고하는 소통문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기관리 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규모 문건 유출이 확인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청와대 관계자들도 듣고 새겨야 할 지적이다. 교수들이 올해 선정한 사자성어가 왜 ‘지록위마(指鹿爲馬)’인지 곱씹어볼 일이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155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