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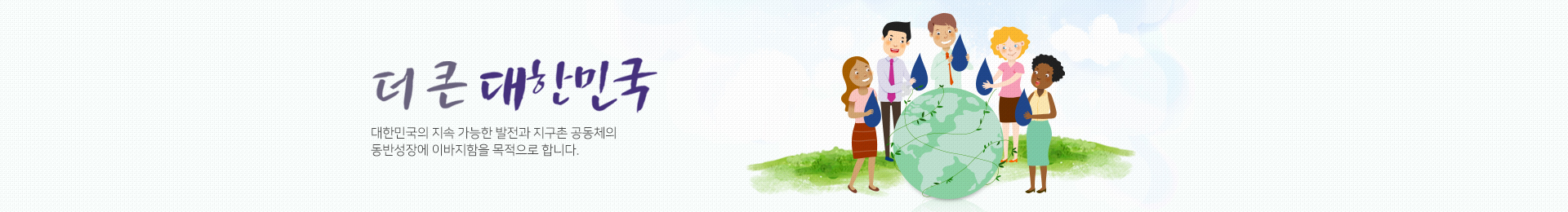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김상협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국제사회에서 한국 특유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모습이다. 물리적 영토는 그대로지만 워싱턴과 베이징, 파리와 다보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모두 흔들리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고 있다.
먼저 국력의 기본이라는 경제부터 살펴보자.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2014년 3분기 이래 6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 경제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한때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하며 경제 영토를 확장하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끄는 환태평양 신(新)통상질서에서 소외된 존재가 됐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매출 비중도 산업화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는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얼마나 허전할 것인지를 예고했다. 스마트폰이나 TV, 냉장고 등 현재의 제품은 여전한 편이지만 전기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미래 성장동력의 주역은 다른 나라가 되리란 걸 보여줬다.
군사력은 또 어떤가?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지만 수소탄인지 뭔지 개발했다는 북한의 한 방에 `경제·안보 모두가 위기`라는 호소가 국가 위정자로부터 나왔다. `편향 시비`를 감수하고 우리 외교가 그렇게 공들였다는 중국의 경우 베이징 수뇌부는 한국의 급박한 요청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미국은 B-52 폭격기를 한반도로 보내긴 했지만 백악관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버디(Buddy)`라 부르지 않는다고 워싱턴 정가는 전한다.
`소프트 파워`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연말 파리에서 유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는 한국의 실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가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31위에서 5년 만에 54위로 추락해 시계를 거꾸로 돌린 `백 슬라이딩(back sliding)` 국가로 손꼽혔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정상이 `기후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이 시대 최고의 도전이자 수십조 달러의 기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천명한 시점에 한국 수석대표인 환경장관은 협상 기간 도중에 귀국해 조크의 대상이 됐다. 최재철 기후변화대사는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19세기 말을 보는 느낌"이라는 소회를 털어놓았다.
얼마 전 다녀온 다보스포럼에서도 한국의 부재감이 확인됐다. 지난 21일 개최된 코리아 나이트는 영향력 있는 외국인을 찾기가 어려웠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인도네시아에까지 손님을 뺏긴 탓이다. 포럼 기간 내내 한국이 주도하는 세션은 자취를 감췄고 `안 보이는 것 자체가 눈에 뜨인다(conspicuous by absence)`는 존재는 더 이상 아니었다.
세계경제포럼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요 20개국(G20)과 개발협력, 녹색성장처럼 한국이 선도했던 의제 설정 역량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6월 미국외교협회(CFR)가 펴낸 `중진국 한국, 글로벌 어젠더에의 기여(Middle-Power Korea : Contribution to the Global Agenda)`라는 보고서는 그 이유를 한국의 정치에서 찾았다. 편가르기 정파적 다툼에 사로잡혀 스스로 한국을 `끌어내린다(downplay)`는 것이다. 집안 싸움이 잦으면 가세가 기우는 것처럼 작금의 정치는 국민의 집인 국가를 내리막길로 모는 자해를 일삼고 있다.
올해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줄기 시작하는 첫해이기도 하다. 유권자가 아예 없어질 때까지 이런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인가? 이탈리아 상원처럼 의원 수가 3분의 1로 줄고 입법권과 월급까지 박탈되는 응징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77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