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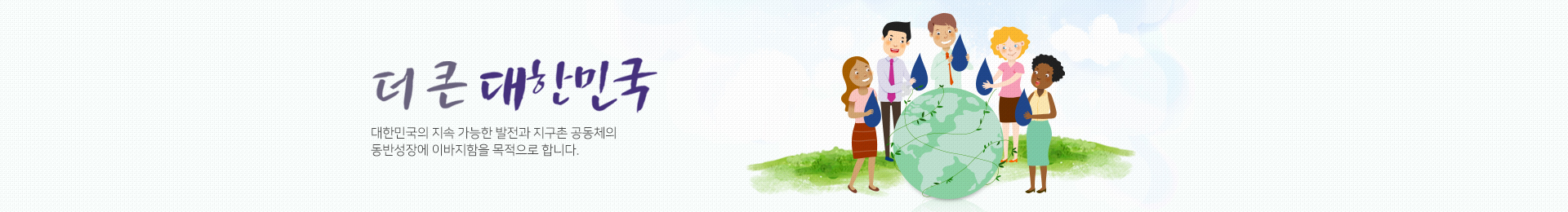
김대기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각에서 우리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는 물론 추경까지 거론하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지표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다. 경제 정책의 세 가지 목표인 성장, 물가, 경상수지 모두 호조다. 3% 수준 성장은 뉴노멀에 비춰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일자리도 지난해 53만개가 늘어나 2002년 이래 최대 수준이고 올해 들어서도 평균 32만명이 늘었다. 재고증가율도 높지 않다. 물가는 1% 이내로 안정돼 있다.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코어물가는 2%대라서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멀다. 경상수지는 더 말할 필요 없이 호조다. 과거 체감경기 불황의 원인이던 주택 경기도 괜찮다. 국제신용평가사는 일본의 국가신용은 낮춘 반면 한국 등급은 상향 조정했다. CDS도 거의 최저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금도 몰려왔다.
지표상으로 괜찮고 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 체감경기는 비관적일까? 가장 큰 이유는 수출 부진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다. 그래서 수출이 악화되면 불황감이 크다. 특히 대기업들이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납품단가부터 깎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곧 수천, 수만 개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면서 냉기가 급속도로 확산된다. 올해 들어 동반성장 약발이 시들해지면서 단가 인하 압력이 지나치다는 것이 업계 이야기다.
둘째는 고령화의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다가온 것 아닌가 생각된다. 가구주 평균 연령이 50세가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섣불리 지갑을 열지 않는다. 최근 4년간 가계 평균 소비성향이 4.6%나 줄었다. 이미 일본이 경험했듯이 고령화는 결국 저소비·저성장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과다한 가계부채도 당연히 소비 여력을 잠식한다.
셋째는 심리적 요인이지 싶다. 경제가 잘되려면 사회에 활력이 붙고 신바람이 나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지난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 대상이 된 재계는 자원 개발, 해외 비자금, 방산 등 비리 수사까지 겹치면서 몸조심 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회장이 구속돼 있는 대기업들의 시간은 멈춰 있다. 사면도 가석방도 안된다고 하니 정작 좋아할 사람들은 외국 경쟁 기업들이다. 관피아, 연금 개혁, 김영란법 등으로 연타를 맞은 공무원사회는 신나게 일할 분위기가 아니다. 국가의 두뇌 역할을 맡은 정치권이 스캔들과 무능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민은 희망을 잃고 있다.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면 음식점 등 밑바닥 경기부터 식어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고 체감경기가 좋아질까? 경기 부양은 말은 좋지만 사실 전부 빚이다. 구조적·정치적인 문제를 경기 부양으로 대응하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사실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리고 있다. 올해 들어 원유와 광물,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은 GDP의 4~5% 이상 수준의 재정지출 또는 세금 감면과 맞먹는다. 따라서 지금은 경기 부양 이전에 체감경기 불황의 근원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 부진이 불황 심리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만큼 동반성장을 강화해서 무리한 납품단가 삭감부터 자제하도록 만들자. 개혁과 사정 작업도 빨리 끝내서 사회 분위기를 바꾸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자. 매년 짙어지고 있는 고령화와 결국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제조업 대책이 시급하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언젠간 다가올 고유가 및 원자재난에 대비한 태양광 등 에너지원 개발과 중장기 자원 확보 방안,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원화 국제화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저유가·저물가·저금리 시대인 지금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497902
